상세 컨텐츠
본문
사람들은 무언가에 몰두한 사람들에게 그걸 왜 하냐고 묻는다.
답은 간단하다.
재밌어서!
하지만 욕구에 충실하다 보면 생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건 생물계 태고의 딜레마다.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욕구에는 제한이 없다.
어떤 욕구는 인구까지 증가시킨다.
이런 조건에서 경쟁의 발생은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그렇게 동물들은 무리의 우두머리를 뽑고
인간들 사이에는 계급이 생긴다.
그리고 경쟁은 판도를 바꾼다.
과학기술의 폭발기엔 늘 전쟁이 있었다.
이안 굿펠로우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판도가 바뀌면 새로운 지식도 생기기 마련이다.
지식은 지식을 낳는다.
지식은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물질적 풍요는 인간에게 흥미로운 지식을 탐할 여유를 제공한다.
이 아름다운 순환은 인간에게 연구라는 마약을 낳았다.
그러나 풍요는 모두가 누리는 것이 아니다.
경쟁은 다시 돌고 돈다.
자, 이제 연구는 욕구 충족의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욕구에 충실하다 보면 생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내 재미 채우자고 생계를 뒷전으로 할 수 없다.
문명사회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남의 욕구도 맞춰주어야" 한다.
내 욕구만 챙기다간 아작난다.
생계 유지의 토대 위에 연구가 있다.
예로부터 학문은 귀족 계층, 상류층들의 영역이었다.
이는 연구도 마찬가지였다.
연구의 본질은 생산활동이 아니다.
연구는 지식변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이다.
고위층들은 그들의 생계를 지탱해 줄 '하층민들' 또는 '자본'이 있었다.
그 굳건한 토대 위에 그들은 '연구라는 사치와 향락'을 즐기다가
연구가 잘 되면 유명한 서적이나 명예를 남긴 채 죽을때 까지 연구하다 가는 것이다.
나는 '가난한 연구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지식변태, 좋다.
그런데 자기 생계는 챙기고 나서 향락과 사치를 부려야 하는 거 아닌가.
가난한 연구행위라는 건 뭔가 고결하고 사명감있는 행위가 아니다.
그냥 자기 재밌어서 생계가 뒷받침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미에 빠져서 못 헤어나오는 것이다.
내가 너무 막말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도 인정할 것이다.
그냥 자기가 빠진 그 연구분야가 너무 즐거워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사실 그들에게는 그게 생계도 버릴만큼, 나름대로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연구가 생계를 지탱해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그것은 남이 시키는 연구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는 결국 남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이용된다.
그런 형태의 연구는 대부분 재미가 없다.
연구를 재미로 하는 사람들은 이 말에 격하게 공감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사실 이 이야기는 나 자신에게 다짐하는 글이다.
다음의 연속된 독백적 문장으로 끝마치겠다.
나는 금수저가 아니다.
생계는 뒷받침되지 않는다.
나는 즐기면서 연구해도 탑티어 연구자들의 성과만큼 나올 1% 연구자는 아닌거 같다.
그런데도 나는 연구하고 싶다.
우선 생계부터 챙기자.
연구로 벌어먹되 일과 내 연구를 잘 분리하자.
그리고 그 일을 챙겨야 생계가 챙겨진다.
사치와 향락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은 수요에 맞추자.
그게 장기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길이다.
'연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니 배치에 대한 고찰 (2) | 2021.03.12 |
|---|---|
| Breakout 조지기 (0) | 2021.01.24 |
| Pong 존버 승리 (7) | 2021.01.14 |
| 유전 알고리즘 - 컨셉 (2) | 2020.02.14 |
| 유전 알고리즘 (2) | 2020.02.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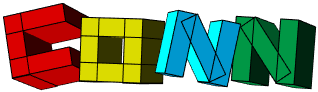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