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확률과 통계를 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할 때마다 자꾸 머릿속을 빙빙 도는 생각이 있다.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 목적은 주로 최적화 기법이나 기계학습에 이용되는 내부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쌓아올린 기초지식은 주로 추정(추론) 기법으로 귀결된다. 추정 기법이란 값을 예측하거나, 여러가지 답안 중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오늘 베이지안 추론을 공부하다 그 생각이 폭발했다. 그 생각이란 바로, 인간이 의사결정을 할 때 실제로 뇌 속에서 이러한 확률적 추정법이 사용되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저녁으로 햄버거를 먹으러 롯데리아를 갔다고 하자. 햄버거를 좋아하는 철수는 오늘따라 티렉스버거가 급삘이어서 티렉스버거를 주문했다. 여기서 티렉스버거를 선택하게 한 급삘이 철수의 뇌 속에서는 실제로 어떤 작용이었을까?

당연한 말이지만 메뉴를 선택한다고 뇌 안에서 무언가 통계적이고 확률론적인 수식이 세워져서 계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히 철수가 티렉스버거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무언가 뇌 속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일어났다. 우리가 그 과정을 정확히 해석해낼 수는 없지만, 몇몇 뉴런들의 물리적 작용의 결과임은 분명하다.
만약 우리가 그 뉴런들의 물리적 작용을 해석해낼 수 있다면, 그 해석의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 비록 그 작용에서 복잡한 확률론적 기법이나 수식 같은 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그 뉴런들의 전기·화학적 신호가 작용하는 모습이 실제로 확률·통계적 추정 과정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각 반마다 인원수가 30명인 12개의 반에 햄버거를 돌리려면 박스당 20개의 햄버거 몇 박스를 구매해야 하는가'와 '30×12÷20=?'이 표현만 다르지 결국은 같은 문제다. 철수가 뇌의 뉴런을 사용해 티렉스버거를 선택한 것이 철수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확률론적 추정 기법을 이용해 철수가 어떤 햄버거를 선택할 것인지 예측하는 것과 동치일 수도 있다.
물론 아닐 수도 있다. 해석적으로도 철수의 뇌와 확률론적 추정은 유사하기는 커녕 전혀 다른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다. 그래도 분명 메뉴 선택은 치밀한 의사 결정 과정이다. 우리가 직접 뉴런을 설계해서 그 과정을 똑같이 재현하지는 못해도, 해석적으로는 뇌의 의사결정 과정을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다분히 기능주의적이다. 기능주의는 심리철학 용어로, 심적 활동에 대해서 논리적인 기능이 동일하면 그것의 물리적 구현은 어떻든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뉴런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고 살아있는 생명체의 두꺼운 두개골 내에 있기에 그 작용을 제대로 관찰하기란 매우 어렵다. 관찰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의 해석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난해하다. 신경과학의 발전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색 > 인지과학적 사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돌연변이(Mutation)의 중요성 (0) | 2020.10.11 |
|---|---|
| 교사가 움직일 것인가, 학생이 움직일 것인가 (0) | 2020.04.13 |
| 진화에 목적은 없다 (3) | 2020.02.17 |
| 대의와 소의 (6) | 2020.01.26 |
| 인공지능이 소설을 쓴다? (2) | 2019.12.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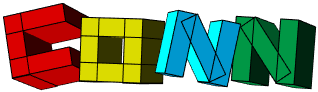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