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이 생각은 올해 초 버스정류장에서 자연어처리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다.

인공지능 분야가 발달하여 소설을 써냈다는 이야기가 돌곤 했다. 이제는 그러한 경향이 점차 사그라들고 있지만, 2016년 알파고가 유명세를 타면서 인공지능의 수준이 상당히 과장되어 전달된 탓에 당시에는 'AI가 무섭다'라는 반응이 꽤나 있었다.
소설을 쓴다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인공지능이 한 것은 기존 소설의 텍스트를 1000편이 넘도록 학습한 다음 학습한 텍스트들로부터 통계적인 방법으로 그럴듯한 문장을 구성한 것뿐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작활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이 소설을 쓸 때는 단순 텍스트 뿐만이 아닌 일생토록 겪은 수많은 경험들이 합쳐져 문장을 구성해낸다. 인공지능의 소설 작성 원리를 알고 보면 인간에 결코 비할 바가 못 된다. 그것은 근사한 통계적 기술이지, 'AI 작가'가 아니다.
그러나 연구진들의 성과를 평가절하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 어느정도 문맥의 일관성이 있는 그럴듯한 문장을 여러 묶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성과이다. 50년대부터 시도되어온 인공지능의 꿈에서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 내려는 연구진들은 수많은 좌절을 겪어야 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이다. 정교한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알고리즘으로 인공지능을 설계하려는 계산주의적 접근은 사실상 실패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대두된 인공신경망을 사용한 연결주의라는 새로운 접근이 수년에 걸쳐 발전했고, 이를 문장 구성에 적용하여 연구한 끝에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 내는 데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이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한 편의 복잡한 이야기가 담긴 소설을 써낸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야말로 소설같은 이야기인 셈이다.

어찌되었든 문장을 그럴듯하게 구성하는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공지능이 글을 더 정교하게 쓸 수 있을까? 실제로 인공지능이 쓴 글을 보면 글 전체 구성이 다소 난잡하다. 인간의 행동에서 생각해보았다. 보통 공식적으로 장문의 글을 써야할 경우 개요를 짜서 글의 전체 구성을 먼저 잡은 뒤에 글을 쓰기 시작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잘 짜여진 글을 쓰는 것은 인간조차 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요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소설 쓰는 인공지능을 생각해보자. 인공지능은 통째로 글을 작성한다. 어떠한 임의의 입력이 주어지면, 그 입력에 맞게 글을 통째로 뽑아낸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가? 뇌에 있던 생각들이 한 번에 정리되어 통째로 글을 쏟아내는가? 그렇지 않다. 인간은 글을 쓸 때 계속해서 자기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고, 전체 글의 구성이 어색한지 점검하고, 이상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수정하고, 생각하고를 반복한다. 즉 인간은 글을 쓸 때 한 번에 글을 써내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허용한 상태로 일정량의 글을 쓴 다음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고 판단한 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며 글을 써낸다.
개요를 짜면서 글의 전체 구성이 머릿속에 형성된다. 이 전체 구성을 잊은 경우 짜놓은 개요를 참고하면 된다. 이후 글을 쓰면서 써놓은 글들을 재점검하며 머릿속에 있는 글의 전체 구성과 비교하여 수정 사항을 선택한다.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다보면 개요에 맞는 정교한 글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글쓰기 과정을 소설 쓰는 인공지능에 적용한다면 좀 더 정교한 글의 작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현재 인공지능은 통째로 글을 쓰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보기에 부족한 것이다. 스스로 쓴 글을 읽어 평가 및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동작한다면 인공지능도 탁월한 글을 써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껏 인공지능은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글을 써왔다. 이제는 인공지능도 글쓰기 수업을 들을 때가 된 것이 아닐까.
'사색 > 인지과학적 사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돌연변이(Mutation)의 중요성 (0) | 2020.10.11 |
|---|---|
| 교사가 움직일 것인가, 학생이 움직일 것인가 (0) | 2020.04.13 |
| 인간의 의사결정과 확률·통계적 추정 기법 (3) | 2020.02.26 |
| 진화에 목적은 없다 (3) | 2020.02.17 |
| 대의와 소의 (6) | 2020.01.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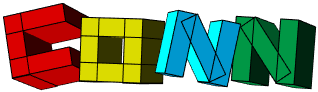





댓글 영역